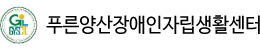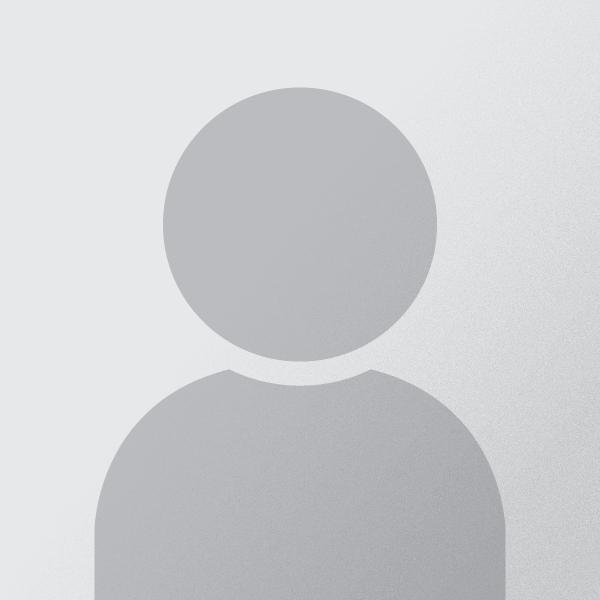[더인디고=박관찬 기자] 책을 출간한 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만큼 그 사람들의 다양한 성향을 접하게 되는데, 특히 기자가 가장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법인 손바닥 필담을 통해 그 성향을 느끼곤 한다. 어디까지나 기자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손바닥 필담을 20년 넘게 첫 번째 의사소통 방법으로 사용해온 기자의 경험상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다고 생각한다.
북콘서트 마지막 시간은 사인회였다. 기자로부터 책에 사인을 받기 위해 독자들이 줄을 섰는데, 덕분에 독자 한 명 한 명과 직접 인사를 나누고 책에 사인을 할 수 있었다. 당시 기자 옆에 속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독자가 기자에게 하고싶은 말을 말로 하면 실시간 문자통역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몇몇 독자들은 기자와 ‘직접’ 소통하기 위해 기자의 손바닥에 자신의 이름과 북콘서트 소감을 적었다.
그중 기억에 남았던 한 독자가 있다. 그는 기자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는데, 기자의 손바닥에 글을 적어주는 방법이 인상적이었다. 자신의 위치에서 기자의 손바닥에 글을 적으면 기자의 입장에서 읽을 때 글자가 뒤집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기자가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본인이 글자를 뒤집어서 적은 것이다. 즉 자신의 위치에서 글을 쓰지 않고,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글을 쓴 것이다. 기자를 배려해준 마음이 참 고마웠다.
또 어떤 독자는 기자에게 이야기할 때 왼손으로 기자의 오른 손목을 그야말로 ‘꽉’ 움켜쥔 채 오른손으로 기자의 손바닥에 하고싶은 말을 적었다. 기자의 손목에 어찌나 힘이 잔뜩 들어갔던지, 기자는 손바닥을 꼼짝하지도 못하고 단단히 고정해둔 채 독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다. 지금 고백하자면 독자의 마음은 기자의 손바닥을 고정하기 위함이지만 그 힘이 너무 강하게 기자에게 전달되어 웃음이 났다.
그 외에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글씨를 적는 사람, 손바닥이라는 공간이 제한적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알만큼 글자를 작게 쓰는 사람, 손바닥이라는 공간을 가득 채워서 시원시원하고 큼직큼직하게 글을 쓰던 사람, 한 단어씩 쓸 때마다 기자가 제대로 확인했는지 기자의 얼굴을 보는 사람 등등 다양한 유형의 독자들이 있었다.
나름대로 예상해보는 성향
사람들이 기자의 손바닥에 하고싶은 말을 글로 적을 때, 보통 기자는 가만히 있기보다 손바닥에 적히는 글을 따라서 읽는 편이다. 그러다 보면 굳이 상대방이 하려는 말을 끝까지 손바닥에 적지 않아도 다 이해하곤 하는데, 여기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요즘 기자의 손바닥에 글을 적어주는 사람들 중에서 기자가 가장 선호하는 유형은 검도관 관장님이다. 관장님은 수련 중에 하고싶은 말을 직접 기자의 손바닥에 적어주시는데, 항상 관장님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위치, 기자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서 손바닥에 글을 적어주신다. 그리고 관장님이 적어주시는 말을 기자가 조기에 이해하고 뒤에 이어질 관장님의 말씀을 다 이야기해버리면 관장님은 굳이 끝까지 적지 않고 기자가 이해한 게 맞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바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간다. 덕분에 조금이라도 수련의 시간을 늘릴 수 있다. 그만큼 관장님이 적어주시는 글자가 큼직큼직하고 적는 속도도 알아보기 편하다.
그런데 어떤 분은 기자의 손바닥에 글을 적고 있는 내용을 기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무슨 내용인지 말해도 끝까지 하고자 하는 말을 기자의 손바닥에 적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기자는 혹시라도 기자가 이해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손바닥에 적히는가 싶어 끝까지 집중하게 된다. 하지만 끝까지 적힌 내용이 기자가 생각했던 내용과 같으면 뭔가 무안해진다. 이때 드는 고민이 대화상의 ‘예의’가 아닐까?
상대방이 말하고 싶으면 그 말이 다 끝날 때까지 끊으면 안 되는 게 기본적인 예의다. 손바닥에 글을 적는 것도 하나의 의사소통 방법이기에 상대방이 말하는(정확하게는 손에 글을 쓰는) 동안 끝까지 집중해서 경청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 이해했다면 다음 주제로 이야기가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한다.
또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은 기자의 손바닥에 온전한 ‘글자’만 적지 않는다. 하나의 단어를 쓰고 띄어쓰기를 해야 할 때는 잠시 기자의 손바닥에 본인의 손바닥을 접촉해 둔다. 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처럼 글자 외에도 웃는 표정, 물결표, 온점 등 각종 이모티콘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기자에게 하고자 하는 말의 ‘분위기’도 생생하게 들려 준다.
어찌 보면 손바닥 필담은 단순히 한 가지의 의사소통 방법에 불과할 수 있다. 하지만 손바닥이라는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임에도 이렇게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과 엮이게 된다. 기자가 저시력이라서 잘 보지 못하는 상대방의 표정, 듣지 못하는 상대방의 목소리를 기자의 손바닥에 전달되는 글자의 크기나 쓰는 방법, 손목을 받치기 위해 잡은 힘 등을 통해 대신 알게 되는 것 같다.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56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