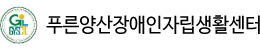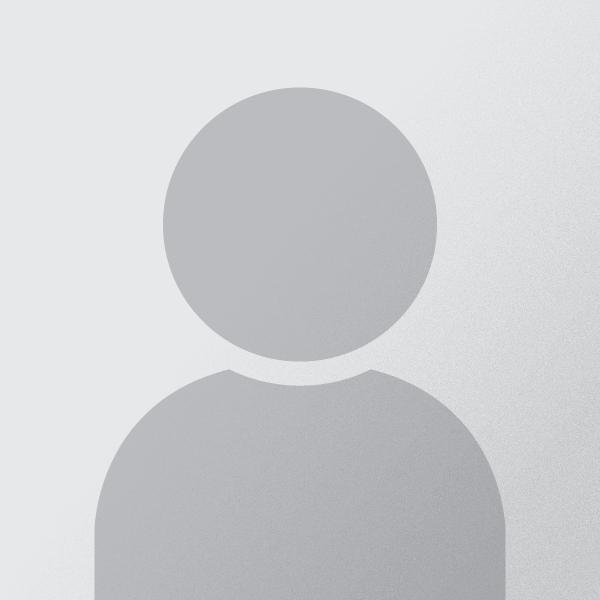[더인디고=이민호 집필위원]
선선한 바람이 부는 10월을 만끽하기 위해 전동휠체어 속도를 최대한으로 올린 채 산책을 하고 있었다. 어디선가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 보니 초등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해 학교 담장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반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다 함께 줄넘기하고 있었다. ‘하나, 둘’, ‘하나, 둘’ 선생님 구령에 맞추어 용수철처럼 하늘로 뛰어올랐다가 바닥에 내려왔다. 바닥에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뛰어올랐다. 무엇이 그리 신났는지 깔깔거리며 함박웃음을 짓고 있었다.
나도 덩달아 즐거워졌다. 그때 갑자기 ‘휘익~’하고 불어온 바람 때문에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눈을 다시 뜨니 운동장에 있던 아이들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다.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니 어느 텅 빈 교실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다. 아까 타고 있었던 전동휠체어는 온데간데없었다. 잘못 본 것 같아서 눈을 비비고 주변을 돌아보니 커다란 칠판이 있었고, 오른쪽 구석에 떠드는 사람들의 이름과 체육 시간에 가을 운동회 연습이 있으니 체육복을 갈아입고 오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워 머리를 감싸고 책상에 엎드렸다.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외치고 고개를 번쩍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풍경은 그대로였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나는 과거의 어떤 날로 돌아온 것만 같았다. 의자에서 일어나 절뚝거리며 천천히 교실을 둘러보다가 ‘공산국민학교’라는 이름이 적힌 거울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거울을 보니 내 어릴 적 모습이 나타났다.
급하게 내 책상으로 돌아와 가방을 거꾸로 뒤집으니, 안에 있던 내용물이 쏟아져나왔다. 허겁지겁 손에 잡히는 책을 들어 뒷면을 돌려보니 ‘4-1, 이민호’라는 앳된 글씨가 적혀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의자에 앉아 있으니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던 깔깔거리는 소리가 창문을 타고 넘어왔다. 밖을 보니 40여 명 남짓 되는 아이들이 선생님 구령에 맞추어 줄넘기하고 있었다.
그렇게 20여 분이 지났을까? 우당탕우당탕 뛰는 소리와 뛰지 말라고 호통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드르륵거리며 문이 열리며 아이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내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남자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옷을 갈아입었고, 여자아이들은 옷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다.
가장 늦게 들어온 선생님은 교탁 밑에서 서류를 꺼내시며 나에게 “민호야, 교실 잘 지키고 있었니?”라고 물었다. 동그란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선생님은 고개를 숙이고 서류만 보았다. 옷을 다 갈아입은 아이들이 돌아오니 서류를 덮으며 “아까 복도에서 뛴 아이들 다 기억하고 있으니, 다음부터 그러면 혼난다”라며 경고를 했다. 그리고 운동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반장이 인사를 하고 수업을 마쳤다.
가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할 말이 있으시다며 나에게 잠시 교탁으로 오라고 했다. 가까이 다가가니 “민호야, 너는 다리가 아파서 운동회 때 할 수 있는 게 없을 테니 계속 교실을 지키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 부탁이나 당부가 아니라 지시에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에 반문하기 어려웠다. 고개를 끄덕이는 나에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구나.”라며 마무리 지으셨다.
가방을 챙겨 교실 밖을 나오니 다른 반에 있던 친구가 같이 가자며 기다리고 있었다.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집에 도착하니 낯선 모습의 가족들이 나를 반겼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부모님이 질문하셨지만, 걱정을 끼칠 것 같아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자리에 누웠지만, 바로 잠이 오질 않았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제시간에 일어나지 못해 교실에 겨우 도착했다.
그렇게 며칠을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이 시간과 공간에 익숙해져 원래의 모습은 있었다. 어김없이 교실에 늦게 도착해 자리에 앉자마자 선생님께서 오늘 특별활동 시간이 있지만, 운동회 연습으로 대체한다고 하셨다. 아이들의 들뜬 분위기가 교실에 가득 찼지만, 나는 거기에 끼지 못했다. 특별활동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저마다 체육복을 갈아입고 썰물처럼 교실을 빠져나갔다.
나는 또다시 텅 빈 교실에 혼자 남겨졌다. 창문 밖 운동장에 모인 아이들은 국민체조를 하고 훌라후프를 돌리기 시작했다. 구령과 웃음소리가 창문을 넘어와 교실을 채우려 했지만, 원래 존재했던 고요와 침묵을 깨트릴 수는 없었다.
그때 어디선가 커다란 바람이 불어왔다. 얼음처럼 침묵을 지키던 커튼들이 너풀거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춤은 교실 끝에서 시작되어 군무가 되었다. 내 옆에서 있던 커튼이 격렬한 춤을 추다가 천장으로 솟아오르는 순간, 그 틈을 비집고 강렬한 햇빛이 내 두 눈을 강타해 질끈 감았다. 눈을 다시 뜨고 다시 주변을 둘러보니 나는 담장 앞에 서 있었고, 눈앞에는 과거로 돌아가기 전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을 보내고 온 것 같았지만, 이곳은 고작 몇 분이 흐른 것 같았다.
머리도 아프고 목도 말라 근처 편의점에서 캔커피를 하나 사서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에 앉아서 참석하고 싶다고 말하지 못한 그때의 나와 나를 배제한 선생님에게 왜 그랬느냐고 질문하고 싶었지만, 이미 지난 과거였다.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교실을 지키며 창문 밖 비장애인 친구들의 체육활동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이민호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그때 겪었던 외로움과 소외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거대한 ‘통합교육’을 말하는 것도 좋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먼저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59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