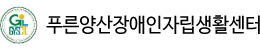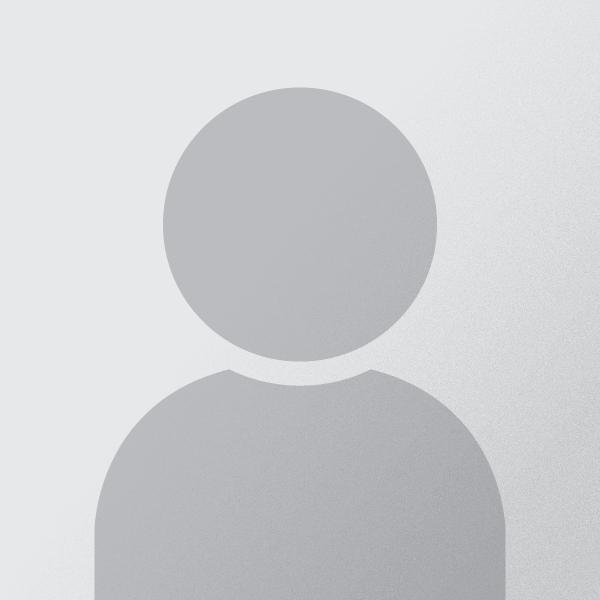[더인디고=박관찬 기자] 오는 30일(금) 저녁 7시 30분 AK아트홀에서 “어둠속음악회”가 열린다. 가야금, 건반, 드럼, 첼로, 해금으로 구성된 전문연주단체 ‘앙상블 수’가 장애예술가들과 함께 공연한다는 것, 그리고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의 관점에서 느껴보는 음악회로 준비한다는 것만으로도 특색이 있는 기획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획 못지않게 기획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과정’에서도 특색과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시청각장애를 가진 첼리스트와 앙상블 수의 합주는 단순히 ‘좋은 연주’가 되도록 박자를 잘 맞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연주 전후 신호와 무대에서의 인사 등 연주 외의 소소한 부분까지도 함께 맞춰가며 음악회를 함께 준비하고 있다.
합주를 준비하고 있는 두 곡은 모두 시청각장애인 첼리스트의 연주에 피아노 반주가 함께 1절을 연주하고, 2절부터는 첼로 연주에 앙상블 수의 모든 악기가 함께 들어온다. 얼핏 이 문장만 보면 첼리스트는 그동안 연습하던대로 1절과 2절을 박자에 맞게만 연주하면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저시력으로 인해 첼리스트의 연주 위치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야금과 첼로만 조금 볼 수 있고, 다른 악기의 연주는 전혀 보지 못한다. 또 본인의 연주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가야금과 첼로 연주가 시작했는지, 지금 함께 잘 연주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간혹 연주 중 가야금이나 첼로의 연주자가 제법 큰 동장이나 움직임이 나타날 때면 ‘혹시 내가 잘못된 걸까?’와 같은 질문을 계속 던지며 연주를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곤 한다.
또 합주의 횟수를 거듭할수록 함께 연주하는 악기들의 소리를 듣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일어난다. 들을 수 있다면 첼로의 멜로디 연주에 다른 악기는 어떤 소리를 내면서 연주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혹시 박자가 맞지 않는 부분을 듣게 되면 템포를 조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앵콜은 처음부터 같이 연주하는 게 아니라, 2절부터 시청각장애인 첼리스트의 연주가 함께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신호’다. 이미 1절 연주가 시작되었으면 그동안 첼리스트는 대기하고 있다가 2절이 시작될 때 맞춰서 연주를 하면 된다. 하지만 첼리스트는 청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앵콜 곡의 1절 연주가 시작했는지, 지금 어느 부분을 연주하고 있는지, 언제 연주를 시작할 타이밍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신호를 보내줘야 하는데, ‘어둠 속’ 음악회이기 때문에 신호를 보내준다고 해도 어두우니까 보기가 쉽지 않다. 무대 위의 모든 연주자들도 이미 1절을 연주하는 ‘중’이므로 첼리스트에게 가까이 와서 신호를 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정한 신호는 ‘찌르기’다.
시청각장애인 첼리스트의 바로 옆에는 앙상블 수의 첼리스트가 위치해 있다. 앵콜 연주 시작 전, 앙상블 수의 첼리스트가 활 끝으로 시청각장애인 첼리스트의 어딘가를 ‘한 번’ 찌른다. 그럼 연주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이고, 몇 분이 지난 뒤 앙상블 수의 첼리스트가 시청각장애인 첼리스트를 활로 ‘두 번’ 찌르면 2절 연주를 시작하면 된다는 신호다.
어떻게 보면 무대에 올라와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한 번 찔러주면 2절 연주를 바로 시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주가 시작되는 순간을 알려줌으로서 처음부터 함께하는 느낌도 들고, 나름 마음속으로 곡의 흐름을 가늠하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2절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앵콜은 시청각장애인 첼리스트가 2절 연주를 끝내고 그 뒤에 몇 마디가 더 연주된 후 진짜 연주가 끝난다. 그래서 시청각장애인 첼리스트는 맡은 연주가 끝나도 다른 연주자들의 모든 연주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여기서도 역시 신호가 중요해진다.
모든 연주가 끝나면 앙상블 수의 첼리스트가 시청각장애인 첼리스트에게 와서 어깨를 한 번 두드려서 신호를 보낸다. 그럼 시청각장애인 첼리스트를 포함한 모든 연주자들이 다 일어나고, 앙상블 수의 첼리스트가 시청각장애인 첼리스트의 어깨를 한 번 더 두드리면 관객들을 향해 인사를 한다.
지금까지 시청각장애인 첼리스트는 단독으로 구성된 연주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인사는 첼리스트 혼자 한다. 그래서 인사는 가볍게 목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앙상블 수와 함께하는 무대에서는 인사의 타이밍과 속도도 함께 맞춰야 한다. 여기서는 장애예술인도 비장애예술인들에게 맞추며 함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어둠속음악회”는 시각장애인의 어둠을 느껴본다는 의미에서 불을 끄고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시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이 어떻게 예술을 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공감하는지를 비장애인과 함께함으로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무조건 장애인에게 비장애인이 맞추는 게 아닌, 장애인도 비장애인, 더 나아가 공동체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어둠속음악회”는 어쩌면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 더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사회를 어떻게 모색해야 할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58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