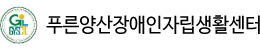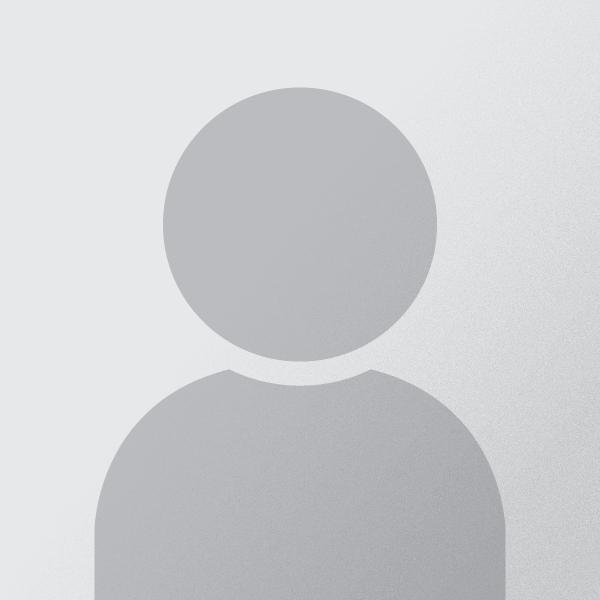- 장애인의 운동할 권리 얼마나 보장되는가?
- ‘장애가 있어서 사고날 것’이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더인디고=박관찬 기자] A초등학교의 교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승마교실을 신청한 자폐성장애가 있는 학생의 신청을 거부했다. 거부 이유는 중증 장애가 있는데 승마수업 수행기관에 재활승마지도사가 없고, 진행하더라도 추가 인력(사이드워커)을 배치해 단독 승마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비용은 학생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학생의 부모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장애에 대한 차별이라고 진정을 냈다. 인권위에서 지난 2월 5일 학교 측의 행위는 차별이며,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보조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더인디고는 이번 인권위의 권고를 통해 장애학생, 더 나아가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사회의 부족한 인식과 개선점에 대해 알아본다.
“다치는 거 아니에요?”
위 사건에서 인권위의 권고내용을 보면 학교측에서 승마수업 수행기관에 재활승마지도사가 없다고 했지만, 장애학생의 참여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없었다고 했다.
이렇게 장애인이 스포츠와 관련된 활동을 하려고 하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장애인의 ‘참여방법’에 대한 검토보다 장애로 인한 ‘사고 위험’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헬스장을 꾸준히 다니고 있는 장애인 B 씨는 “지금까지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사고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새로 등록하기 위해 방문했던 헬스장에서는 ‘장애가 있어서 안 된다’고 거부한 적이 있었다”면서 “안 된다는 이유가 ‘사고가 날 것 같다’는 건데,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날 것 같으면 헬스장 측에서 사고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지 왜 사고난다고 단정짓고 거부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B 씨는 “그동안의 제 경험상 장애인이 운동이나 스포츠 활동을 하려고 하면 관계자들이 걱정이나 우려의 시선을 먼저 보내고 ‘안 하는 게 좋지 않냐’는 말부터 한다”면서 “장애인이 어떻게 하면 운동이나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을 먼저 찾으려고 노력하면 좋겠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부터가 아쉽기만 하다”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청각장애가 있는 C 씨는 “패러글라이딩을 타러 간 적이 있는데, 교관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동행인이 어떻게 타는지를 ‘먼저’ 보고 다음에 타겠다고 하니 교관들이 ‘장애가 있으니 겁내서 그런다’고 하더라”고 하며 “겁먹거나 무서워서 동행인에게 먼저 타라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단정짓고 말해버리는 교관들에게 화가 났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C 씨는 “운동하다가 사고는 장애인이라서가 아니라 비장애인도 날 수 있다”면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것’이라고 단정지어버리는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이 어떻게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는 게 먼저라는 걸 스포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스포츠계 종사자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받을 의무가 없다?
B 씨에 의하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헬스장 등록을 거부한 헬스장에 대해 구청에 민원을 넣고 해당 헬스장 직원들에게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이해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헬스장의 트레이너는 법정 의무교육을 들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B 씨는 “공공체육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하려고 할 경우 50% 할인되거나 무료도 있지만, 정작 관계자가 장애를 이유로 거부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장애인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이라도 꼭 스포츠계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D 씨는 “공공체육시설 종사자라면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반드시 들을 텐데, 온라인으로 교육을 ‘그냥’ 들었거나 처음부터 장애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게 아닐까 싶다”면서 “애초에 장애인이 운동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 좋지 않은 만큼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실제 헬스장의 경우, 상근 트레이너가 있더라도 한 헬스장이 아닌 여러 헬스장에 등록해서 근무하는 프리랜서식의 경우가 있다. 그렇다보니 법정의무교육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공체육시설 종사자라도 단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트레이너도 있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나타날 수밖에 없다.
D 씨는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이 스포츠활동을 ‘관람’이 아니라 ‘직접’ 하는 활동을 많이 개설하면 좋겠다”면서 “이를 통해 스포츠계 종사자들이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스포츠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는 환경을 유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6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