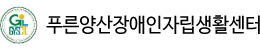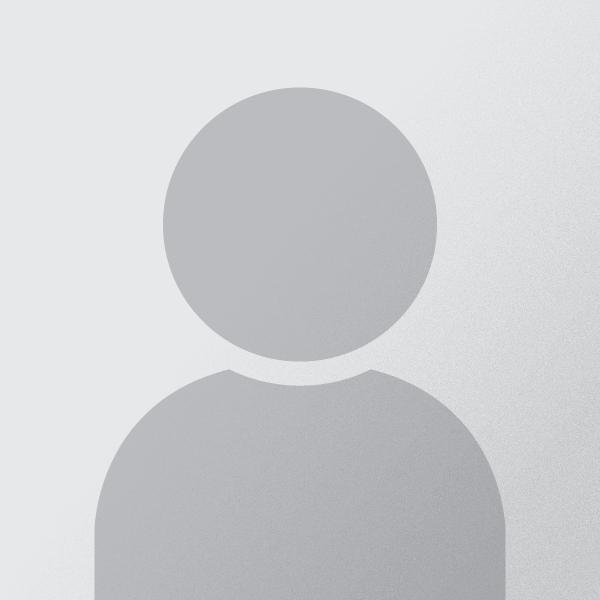- 주식회사 오롯플래닛 최인혜 대표
- 온라인처럼 오프라인에서도 자막 제작이 활성화되었으면
[더인디고=박관찬 기자] 영화, TV 방영 프로그램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하는 OTT(Over-the-top)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아졌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그 접근성이 한층 더 좋아졌다. 바로 ‘자막’을 통해 더욱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디지털 시대에서 자막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최인혜 주식회사 오롯플래닛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젠 콘텐츠 접근을 논할 때 꼭 필요한 것, 자막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을 생각하면 유튜브에서 특정 영상을 시청할 때 자막이 나오는지 여부에 큰 관심을 가지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청각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성은 인지했더라도, 자막이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알게 되지 않았을까? 지금은 청각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자동 자막’을 활용하여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알 수 있다.
“이젠 VOD나 OTT에서 대량으로 자막을 제작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OTT마다 지원금을 주고 500편 이상씩 자막작품을 만들게 되니까 저희도 이 작업을 했었어요.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자막을 통해 콘텐츠 접근성을 고려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젠 자막이 없으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고, 유튜브에서 자동 자막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최인혜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오롯플래닛(이하 오롯)은 문화 콘텐츠의 자막을 제작하며, 뮤지컬 자막 서비스인 ‘유니스텝’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요즘은 자동 자막 기능도 있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막을 제공받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자막 관련 일을 하는 걸까.
“자막사업 한다고 하면 자동자막 있는데 뭣하러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강의자막이나 단독으로 음성이 나가는 게 아니면 보통 소리가 지저분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저희가 주로 하는 작업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극 작품이다보니까 효과음, 배경음악도 필요하니까 자동으로 돌렸을 때는 정확도가 70%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자동 자막을 초벌할 때만 사용하고, 사람의 손이 닿아야 해서 속기사분들도 작업에 많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효과음과 배경음악.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인물이 하는 ‘말’ 외에 중간중간 극 분위기에 맞는 효과음이 나온다. 극의 주제곡이 나올 수도 있고, 그 곡의 가사가 있는 경우에는 가수가 부르는 노래와 극 중의 배우가 하는 말이 겹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자막으로 제작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유튜브에서 자동 자막으로는 보통 ‘(음악)’이라는 자막으로 나온다.
“배리어프리 자막에서 말소리 제외하면 효과음이랑 배경음악 같은 것들은 정확도까지 분석이나 인식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말소리와 배경음악의 노래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 음성 분리하는 것을 연구도 했었는데 사례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걸 주요하게 연구 주제로 잡고 국가에서 해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글자막 제작하면서 중요한 효과음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한다거나 조금씩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젠 뮤지컬(오프라인)에도 자막이 필요하다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청자들을 위해 자막을 제작하는 게 좋은 시도인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콘텐츠를 언제든지 자막으로 제작하는 건 쉽지 않다. 자막 제작이 중요하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작권이기 때문이다.
“저희가 자막을 만들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저작권이었어요. 자막을 제작하더라도 OTT사에서 자기들이 가진 판권이 아니기 때문에 자막을 만들 수 없다고 하거나 배포를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는 자막을 만들 수 있는 인력들은 많은데 활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OTT에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까 거절하다가 국가지원금이 나온 뒤로는 아예 용역으로 내려서 대량으로 자막을 제작했어요. 결국 자막시스템이 있더라도 콘텐츠사에서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막이 제공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작권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의 자막 제작이 시작된 만큼 온라인 콘텐츠에서의 자막 제작과 서비스 제공의 흐름을 최 대표는 ‘물꼬를 트였다’고 표현했다. 아예 자막이 제공되지 않던 곳이 대부분이던 몇 년 전과 비교하면 그만큼 최근 자막 제작과 서비스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 대표는 이제 뮤지컬, 공연, 연극과 같은 오프라인에서의 자막 제작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요즘은 뮤지컬도 SNS에서 짤 같은 거나 릴스를 통해 대중적으로 관심을 받기도 하잖아요. 대중적인 관심을 받으면 청각장애인들도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자막이 제공되지 않으면 함께 관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뮤지컬에도 자막을 제작해야겠다고 느껴서 작년부터 서비스를 론칭했습니다.”
오롯은 청각장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자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담회 형식으로 청각장애인들의 의견을 모은단다. ‘자막에 대한 설명이 많이 적혔으면 좋겠다’, ‘자막에 나오는 한글 단어가 농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서 주석으로 달아줬으면 좋겠다’, ‘자막은 예술작품의 2차 창작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등과 같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자막 제작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결론을 내리거나 정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자막이 친절해야 되고 정보를 많이 제공해야 하긴 하지만 콘텐츠 관람을 돕는 도구로서의 위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더 나아갔을 때 창작자의 권리, 창작물을 뺏어버리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선을 잘 잡는 게 어려운 작업이긴 하지만, 재미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자막 송출을 사람이 해야 되고 자막도 직접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등 온라인과는 확연히 다르다. 하지만 아무리 오프라인 자막 제작을 가속화한다고 해도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굳이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최 대표는 말했다. 당장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는 2025년이 되면 공연장에서 눈 앞에 자막이 뿅 하고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더라고요. 공연장에서 자막을 송출하기 위해 스크린부터 의자 하나하나까지 길이나 위치 등을 체크하면서 ’원시인처럼‘ 작업하고 있습니다(웃음). 그만큼 아직 오프라인에서의 자막이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온라인에서 자막이 제공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6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