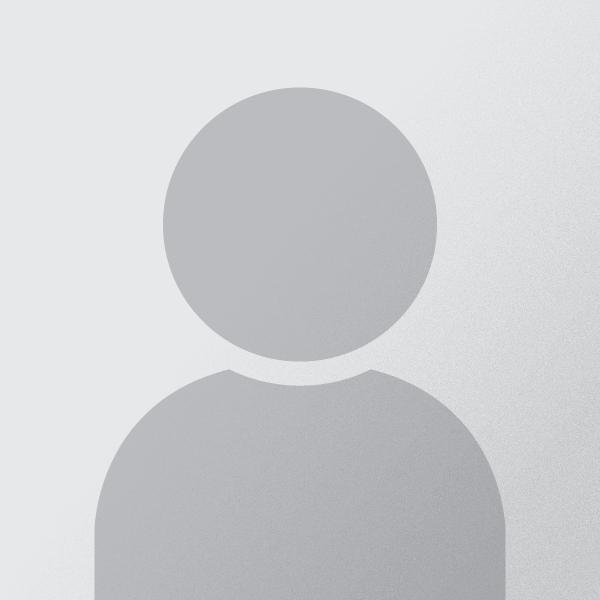[더인디고=박관찬 기자] 5년쯤 전, 서울지하철 9호선 개찰구가 지금의 모습을 하기 전에는 복지카드로 개찰구에 카드를 찍는 게 항상 스트레스였다. 카드가 정확하게 찍혔는지 개찰구에서 나오는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고, 카드가 잘 찍혔다는 시각적인 무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9호선 개찰구는 정말이지 아주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복지카드를 찍고 여유만만하게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단언컨대 9호선 개찰구가 현재의 모습이 된 이후로는 단 한번도 카드를 잘못 찍은 적이 없다. 그만큼 현재 개찰구는 저시력으로 ‘카드가 찍혔다’는 시각적인 정보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개찰구의 카드 찍는 곳에 복지카드를 갖다대면, 그 카드 찍는 것의 12시 방향에 약 30cm 정도는 되어 보이는 제법 긴 길이의 불빛이 나타난다. 카드를 갖다대기 전에는 아무런 불빛이 없다가 카드를 개찰구에 ‘정확하게’ 갖다대면 노란색 불이 반짝하고 나타나는 것이다. 저시력이라도 놓치지 않을 만큼 불빛의 길이도 제법 길고, 색깔도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불빛이 나타나면 개찰구로 진입하고, 아무런 불빛이 나타나지 않으면 카드를 다시 찍으면 된다.
덕분에 이전과 비교하면 훨씬 시각적으로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9호선만큼은 큰 어려움없이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렇게 편안하던 9호선을 이용하는 순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지카드를 개찰구에 찍는 순간 마음 어디선가 불편한 무언가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기자가 복지카드로 개찰구를 찍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개찰구에 복지카드를 찍는 건 주의깊게 살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어쩌면 이건 기자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해당될 것이다. 본인의 교통카드가 잘 찍혔는지 확인해야지, 다른 사람이 찍는 것에 무슨 관심을 가질까 싶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교통카드를 개찰구에 찍는 것을 우연히 확인한 순간부터 기자는 개찰구에 복지카드를 찍는 게 썩 내키지 않은 마음이 생겼다.
복지카드로 개찰구를 찍을 때는 노란색의 불빛이 나타나는데, 비장애인이 교통카드로 개찰구에 찍으면 파란색 불빛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장애인은 노란색, 비장애인은 파란색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굳이 “저 장애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장애인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본인의 교통카드를 개찰구에 찍는 것에만 집중하느라 누가 신경쓰나 싶겠지만, 그래도 ‘장애인’이라고 구분당하는 기분은 지울 수 없다.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편의제공과 같은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온전히 장애인 스스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고, 그런 상황에 놓인 장애인들 중에도 굳이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원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건 괜찮은 걸까? ‘장애인임을 드러내지 않을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하철을 혼자 이용할 수 있을 때처럼, 그런 경우에 비장애인과 색깔로 장애인을 구분지을 필요가 과연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6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