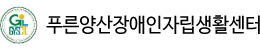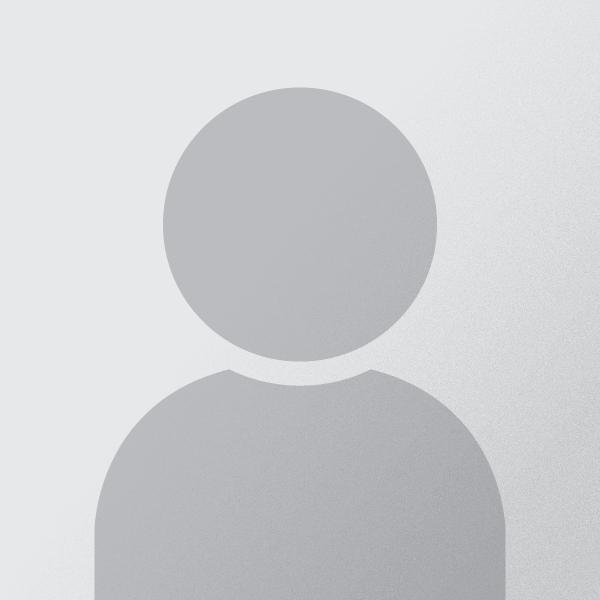얼마전 반가운 손님이 찾아주었다. 1980년대에 자주 만나던 장애인복지신문 김종환기자가 ‘노란들판’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분이 시집을 발간하여 전달하기 위해 왔다고 하며 <통증일기>를 내밀었다. 에이블뉴스를 통해 출간 소식을 알고 있던터라 너무 반가웠다. 기사에서 박정숙이란 인물의 짧은 서사를 읽고 담대하고 현명한 분이란 생각을 했었다.
시집을 펴자 앞날개 작가 소개에 ‘배제와 차별, 학대와 혐오가 만연한 세상에 살아남은 생존자, 나는 60대 장애여성이다’라고 내지르는 통에 나는 찔끔했다. 나도 60대 장애여성이지만 나도 배제와 차별 속에서 살았지만 그녀의 경험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눈길을 오른쪽으로 돌리자 연두색 바탕에 이렇게 적혀있었다. “페친으로 선생님이 올리시는 글 잘 읽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시집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내요.”
가슴이 설레였다. 솔찍히 나는 이유도 모르는 사이에 여성장애인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었는데 나를 끼워주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다. 시집을 단숨에 읽으며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서 그녀에게 받치는 글을 쓴다.

시집 마지막에 놓은 「당신에게」 라는 시는 그녀의 60년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있고, 그녀가 얼마나 넓은 가슴을 가진 따스한 인간미가 넘치는 매력적인 사람인지 잘 나타난다.
첫 행에서 ‘살아야겠습니다’라고 외치며 독자를 긴장시킨다. ‘분명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어깨 펴며 살았던 것 같은데 힘겨웠던가 봅니다’라며 이제 노년기에 접어든 자신의 모습을 인식한다.
그리곤 이내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항변한다. 사랑을 만났고,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이 주는 행복에 힘든줄 모르고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하면서 돈도 명예도 얻지 못했지만 밑지는 장사는 아니라고 자신의 인생을 평한다. 요즘 뉴스는 온통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의 소식뿐인데 자기 인생은 밑지는 장사가 아니였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녀가 부러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시인은 마지막 연에서 독자들에게 선물을 준다.
비록 빈 주머니일지라도
주먹을 펴면
그 안에 따스하게 숨어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박정숙 시인은 자신은 시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통증일기>에 담은 한편 한편의 글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감정들을 걸러내고 또 걸러내어 맑디맑게 정제시킨 가장 귀한 생명수이다. 그녀가 글을 쓰지 않았다면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큰 가슴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박정숙은 우리 시대가 낳은 대인(大人)이다. 아마 다시는 이런 경험으로 <통증일기>를 쓰는 시인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통증일기>는 우리시대의 필독서라고 생각한다. 그녀가 시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했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역시 장애인문학의 역할은 위대하다.
※기사원문-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 idxno=22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