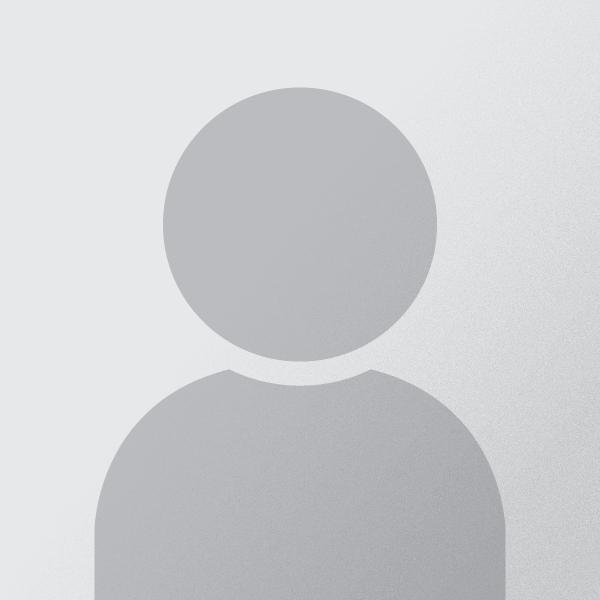[더인디고=조미영 집필위원] 붐비는 전철은 자리에 앉아도 서 있는 사람들의 배만 보여 갑갑하다. 눈을 감으니 덜컹거리는 소음 사이로 내 앞의 청년들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다. 흔한 상소리 하나 없이 조곤조곤 나누는 얘기가 자연스레 내 귀에 들어왔다. 미래에 대한 고민과 여자 친구에 대한 얘기를 진지하게 하는데 갑자기 이들의 외모가 궁금해졌다. 자다 깬 척 실눈으로 광고판을 훑어보다가 청년들의 얼굴까지 훔쳐봤다. 건장한 체격과 반듯한 이목구비가 그들의 대화와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에게 덕담하는 걸 허투루 듣다가 외모 얘기에 긴장하며 귀를 쫑긋 세웠다.
“난 우리 모임이 좋은 이유가 외모에 대해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야.”
“겉모습 따지는 건 미개한 거지. 우리 같은 지성인이면 외모?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영화배우처럼 생긴 청년이 허허 웃으며 말하자 다른 청년도 따라 웃다가 내 정면의 빈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전철 소음에 묻혀 그들의 얘기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한산해진 전철 안에서 나는 좀 더 편하게 그들을 흘끔거릴 수 있었다. 순간 아, 저래서 외모 얘길 했구나 싶었다. 모자를 눌러쓴 청년이 말할 때마다 입이 비뚤어지는 걸 보았다. 나처럼 예민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정도였다. 혹시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인가 생각하다가 눈을 감았다. 그들의 대화가 끊기면서도 간간이 들려왔다. 낭만, 희망, 기대 등 아무래도 이들은 예쁜 단어 골라 쓰려고 일부러 작정한 사람들 같았다. 합정역에 내리려고 출입구 쪽으로 나가서 청년들을 한 번 더 보려고 고개를 돌렸다. 나는 잠시 숨이 멎었다. 외모에 대해 말하지 않는 모임이 좋다던 모자 쓴 청년의 왼쪽 귀가 망가져 있었다. 성형한 흔적인지 원래 그런 모습인지 어설프게 만들어 붙인 듯한 귀 모양에 나는 오래전 사촌 동생의 아들을 떠올렸다.
“언니, 언니 힘들 텐데 이런 얘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승인이 귀가 없어. 구멍만 뚫려서 태어났는데 청력은 살아있대. 좀 커서 인공 귀를 만들어 주면 된다는데 비용이 4천만 원이래. 우리 전세보증금이 4천인데 쟤 수술시키자고 우리 네 식구 다 길바닥에 앉을 순 없어서 고민이야….”
사촌 동생의 말을 들으며 나는 동생의 걱정을 공감하면서도 치료 방법이 있다는 게 부러웠다. 나는 아들이 자폐성 장애인이라 장애는 치료 대상이 아님을 안타까워하며 살고 있다. 치료할 수 있어도 돈이 없으면 더 안타까울 수 있겠다 싶어 사촌동생이나 나나 자식으로 인한 부모 마음 애달픈 건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다. 점점 커가면서 조카가 본인 귀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사촌 동생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하면서 그래도 신체 기능은 있는데 뭐 어때, 라는 생각도 하곤 했다. 나중에 들은 소식은 수술했는데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것과 사춘기 접어들어 외모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머리를 길러 귀를 감추고 다닌다는 거였다. 언젠가 한여름에 만났을 때 하얀 얼굴에 축 늘어뜨린 생머리가 답답해 보여 조카의 고민이 내게로 다가와 짠했던 적이 있었다. 한편으론 외모는 자신이 마음먹기에 따라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여전히 부러운 마음도 있었다.
머리카락이 없어 가발을 쓰고 작은 키를 커 보이게 하려고 키높이 구두를 신었다는 이유로 유명 정치인을 희화화하는 걸 보면서 나는 씁쓸했다. 자신을 돋보이고 싶은 건 취향 문제일 뿐 비난의 대상은 아니지 않나? 물론 그의 정치적 행동을 꼬집기 위해 그렇게라도 공격하고픈 마음을 이해는 하겠다. 그래도 너무 외모에 대한 언급이 많으니까 외모 지상주의가 더 팽배해지는 것 같다.
나는 화장을 안 하는 편인데 직장 다닐 때 미용학원장이던 고객이 나를 볼 때마다 반농담으로 한마디씩 했던 게 기억난다. “미영씨는 참 뻔뻔해, 그렇게 맨얼굴로 다니는 거 보면. 화장하면 좀 이뻐 보일텐데…” 아이 둘 키우며 직장을 다녔던 나는 나를 꾸밀 시간이 없었다. 갓난아기를 멜빵으로 안고 곱게 화장한 엄마들을 보면 저렇게 꾸미는 사이 아기는 뭐 하고 있었을까를 늘 생각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남이 하면 엄청 대단해 보이던 시절이었다. 지나고 보니 시간이 있어도 나를 꾸미지 않는 건 내 성격 탓이었다. 게으름도 한몫했다.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제 기능을 다해도 감추고 싶은 이들에겐 가혹한 형벌이겠다. 자폐인 아들의 튀는 행동에 항상 따라오던 타인의 시선이 나를 불편하게 했던 지난날을 생각하면 그것을 무시하는 데 긴 세월이 필요했다. 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사회의 분위기가 보이는 것에 대한 과도한 반응을 멈추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글을 쓰다 보니 전철 안에서 힐끗거린 내 행동에 대해 반성하게 된다. 내 딴에는 그들이 눈치 못 채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마음 근육을 키워 내가 해결했던 외부의 눈총이었음을 생각하니 부디 그 청년도 다른 이의 시선쯤 아무렇지 않았기를 바라 마지않으며 뒤늦은 사과의 마음을 보낸다.
타인의 외모에 대한 과한 언급보다 부조리한 사회의 여러 상황에 마음 모아 연대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62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