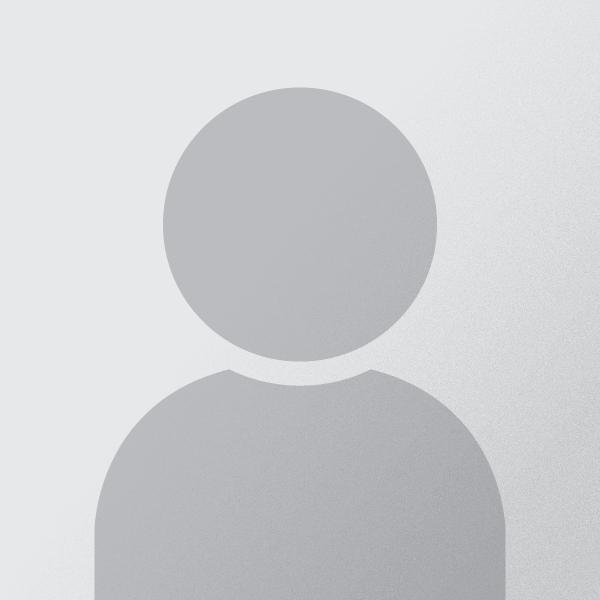【에이블뉴스 조현대 칼럼니스트】사회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가족'의 형태와 의미도 크게 달라졌다. 과거 대가족 중심의 사회에서는 가족이 곁에서 서로를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외동으로 끝나는 가정도 많고 부모와 자식 간의 정서적 거리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가족과의 단절로 인한 고립은 더욱 심각한 현실이 되고 있다.
강남에 살고 있던 75세의 장애인은 그야말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했다. 그는 1년 전 식도암 진단을 받고 국내 대형 병원을 전전하며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항암치료에 의한 부작용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등 극심한 고통 속에 지내야 했다. 돌봄이 절실했지만, 힘든 상황이 많다 보니 활동지원사들도 하나둘 다 떠났다. 활동지원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정작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마지막을 지킨 한 활동지원사가 있었다. 병원 입원 기간이 두 달을 넘기면 활동지원 서비스가 정지되는 제도 때문에, 활동지원사는 주민센터와 구청을 오가며 민원을 제기해야 했다. 이용자인 시각장애인 어르신은 활동지원사에게 바짝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의사가 포기한 것을 어찌 들어줄 방법은 없었다.
활동지원사의 마음이 몹시 괴롭고 힘들었다. 이용자는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은 고작 180시간에 불과했다. 정해진 시간을 모두 사용하고 나면, 활동지원사는 무상으로 봉사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본인도 지치고 쉴 틈이 없어 구청과 중계기관에 대체 인력 파견을 요청했지만, 현실적으로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
그러다 마침내 활동지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고 찾아오는 이도 없었다. 가족도 없고 지인도 없어 장례까지 치루고 집 정리까지 대신 했다고 한다. 죽고 나서야 20년 동안 단절되었던 아들 딸들이 나타났고, 남아 있는 돈을 상속받기 위함이였다. 활동지원사는 설마 아들 딸이 있다고조차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동안 아무 연락도 없이 이용자 시각장애인 조차 아들 딸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도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까웠다. 시각장애인 공동체에서도 유사한 일이 끊이지 않는다. 필자의 주위에도 맹학교 선배들 중에 집에서 지켜보는 이도 없이 조용히 죽어가는 사람이 여럿 있었다. 중증 질환을 앓거나 암 진단을 받은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센터도 현실적 한계 때문에 손을 놓는다. 시간이 남아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 놓이는 것이다.
하남에 사는 60대 시각장애인은 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바로 시설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홀로 남겨질 미래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처럼 중증장애인 노인의 삶은 고립과 불안,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 속에 있다.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는 여전히 '가족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가족이 있어도 돌봄이 단절된 경우가 많고, 법적으로만 '가족'일 뿐 실질적 관계가 없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 사이에서 장애인 노인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갇혀, 외로움 속에서 생을 마감한다.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특히 장기 입원자나 독거 장애인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과 긴급대응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활동지원 제도 역시 병원 장기입원자에게도 최소한의 돌봄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강남의 그 어르신의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니다. 사회적 관계가 끊어진 채 홀로 남겨지는 노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외로이 죽어가는 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연대와 관심이 절실하다.
※기사원문-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 idxno=225621)